이처럼 사소한 것들 (Small things like these)

사는 곳이 서울이 아닌 남부의 작은 도시라 보고 싶은 예술영화를 보기가 싶지가 않다. 그럴 때마다 문화적 소외감을 슬쩍 느낀다. 발품을 팔고 시간을 내서 서울의 독립예술영화관을 찾아야 하지만 그마저 쉽지는 않아서 스트리밍영화관에서 구입해서 볼 수밖에. 방구석 영화관에서 관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집중해서 볼 수 있고 반복해서 주요 장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주요 장면을 찍어서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저작권침해소지가 있나?). 영화가 원작이 있다 해서 원문으로 읽어 보았다. 영화로 각색된 원작 (클레어 키건의 작품)은 중편이라 할 정도로 두껍지 않은 책인데 제임스 조이스 이후 아일랜드 작가의 작품은 처음이었다. 마치 단편소설처럼 간결하고 차분한 문체. 작가의 감정이입식 감정과 판단이 배제된 마치 다큐멘터리 같은 소설. 하지만 그 울림은 소설만의 힘으로 묵직하게 전해져 왔다. 영화는 원작의 흐름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주요 주제를 향해 응축된 영화적 장면들을 연출한 것 같다.
2024년 내 기준 최고의 영화.
주인공 푸롱역할을 한 킬리언 머피의 연기는 오펜하이머로 그를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깊은 멜랑콜리를 품고 있는 푸른 눈동자. 사회적인 소외와 가난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에 연민으로 낮게 구부러진 어깨, 선한 의지를 혼자 짊어지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적 불의에 맞서는 자의 조용한 결연함 그리고 공감하는 이가 없는 개인적 실존의 어두운 우울. 그에게 강렬하게 매료되었다. 그리고 한 개인을 통해 한 사회의 어둡고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클레어 키건의 섬세하고 단단한 문체와 주제를 전하는 방식. 그의 작품으로 결국 실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수녀원은 조사를 받고 해체되었다 하니 문학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낀다.
It is 1985, in an Irish town. During the weeks leading up to Christmas, Bill Furlong, a coal and timber merchant, faces his busiest season. As he does the rounds, he feels the past rising up to meet him - and encounters the complicit silences of a small community controlled by the Church.
1985년 아일랜드 작은 도시가 시공간적 배경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주간에 걸쳐 일어난 사건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는 석탄과 목재를 파는 목재상 주인이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성수기를 맞이할 예정이다. 하지만 푸롱은 수녀원이 시골 구석구석 사회문화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수녀원의 결정적인 불의와 부정에 우연히 마주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게 되면서 마을 공동체의 어두운 침묵을 깨고 그만의 작은 정의를 실현시킨다.
Claire Keegan’s tender tale of hope and quiet heroism is both a celebration of compassion and a stern rebuke of the sins committed in the name of religion.
영화의 원작자인 키건은 막달라 수녀원에 의해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죄를 소환하고 아주 작은 일로 자신만의 선한 의지로 불의에 맞서는 평범한 소상인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 결국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내는,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잔잔한 감동이 결국 밀물처럼 밀려드는 이야기다.

영화보기에 앞서 원작자 클레어 키건에 대해 알아보면,
그녀는 2022년에 Booker Prize 최종 후보자에 오른 소설가이고 그녀의 작품은 수많은 상은 수상했고 3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 키건은 아리랜드 작은 농장에서 성장했고 17세 때 뉴올린스를 여행하면서 영문학과 정치학을 로욜라 대학에서 수학했다. 1992년에 아일랜드로 돌아와 1999년에 출간된 Antactica로 호평을 받았다.
Claire Keegan was shortlisted for the Booker Prize in 2022. She is a novelist and short story writer, whose work has won numerous awards and been translated into 30 languages.
Keegan was brought up on a farm in Ireland. At the age of 17, she travelled to New Orleans, where she studied English and Political Science at Loyola University. She returned to Ireland in 1992, and her highly acclaimed first volume of short stories - Antarctica - was published in 1999.

첫 장면.
푸롱은 식솔들을 위해 땔감을 주우러 벌판에 나와 있는 소년을 외면하지 못한다.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근황을 살피고 몇 푼의 동전을 건네주는 다정함이 몸에 배어 있는 작은 목재상을 운영하는 소시민이다.
책에서 그가 하는 말을 옮겨보면
Were there any point in being alive without helping one another? Was it possible to carry on along through all the years, the decades, through an entire life, without once being brave enough to against what was there and yet call yourself a christian and face yourself in the mirror?
그는 어떻게 서로를 돕지 않으면서 거울에 미친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는지 강한 사회적 도덕심과 양심을 갖고 있어 보인다.

이 장면 또한 자신이 기독교적 신앙심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도덕적 양심을 배반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따뜻한 집밥이 없어 거리의 쓰레기 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는 가난한 소년의 비참함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따뜻하고 애잔하며 쓸쓸하다.

새벽에 집을 떠나 석탄과 목재를 파는 가게로 트럭을 몰고가는 그. 거친 노동으로 검게 물든 검댕이 손을 북북 문지르며 닦는 일이 그가 가정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는 첫 일상이다. 평범한 소시민의 가정. 그는 세 딸을 둔 가장이다. 딸들은 저마다 자기 일에 정신이 팔려있고 아버지의 귀환이나 일상에 별 관심이 없다. 아내는 집안일에 바쁘고 그는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가장일 뿐이다. 그가 검댕이를 손에서 벗겨내는 장면은 영화에서 중요한 메타포를 갖는 것처럼 자주 반복된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을 파고드는 멜랑콜리한 그의 눈빛. 펄롱 (Furlong)은 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깨어나 여명으로 밖아오는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면서 불우하고 외로웠던 어린시절을 회상한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미혼모였지만 막달라 수녀원에 갇히지 않고 부유했던 윌슨 부인의 선의의 도움으로 그녀의 가정에서 펄롱을 낳고 집안을 돌보며 살게 된다. 윌슨부인의 다정함과 친절한 호의로 사회적 소외와 적대에서 벗어난 그에게 가난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며 소년생활을 하게 되고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어 직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정함과 친절함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

잠 못 드는 밤. 펄롱은 의자에 앉아 어둑한 창문 밖을 보며 회상에 잠긴다. 회상이자 회한인 그의 시간은 적요롭고 침잠하듯 그의 내면으로 그를 이끈다. 과거는 그렇게 현재에 간섭하고 깊게 내면에 묻어있다.

He thought of Mrs. wilson, of her daily kindness of how she had corrected and encouraged him of the smalll things, she had said and done and had refused to do and say the things which added up, amounted to a life. Had it not been for her, his mother might very well have wound up in that place.
윌슨부인. 그녀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 역시 막달라 수녀원이라는 갱생원에 갇혀 평생 세탁으로 강제노역을 하며 자유를 헌납하고 그 곳에 갇혀 지내는 불행한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윌슨부인이 그에게 베풀어준 친절한 말과 행동은 쌓이고 쌓여 그에게 단단한 인생이 되어 조롱을 견디어내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어른이 될 수 있게 한다. 그건 그에게 작지만 소중한 인생경험이었고 그는 절대 잊지 못하고 그의 삶에 지렛대로 여긴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당한 흔적을 아들의 옷을 빨면서 알게 된 펄롱의 어머니. 이 장면도 가슴뭉클한 장면, 자신의 처지로 인해 아들이 받는 수모와 멸시를 엄마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는.. 이 모습 또한 펄롱은 멀리서 몰래 지켜보며 가슴 아파한다.

펄롱의 어머니와 윌슨집안에서 일하는 닉이라는 아저씨의 로맨스. 영화와 원작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원작에선 그저 윌슨부부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오랫동안 펄롱의 어머니 사라와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묘사되며 펄롱의 생부일 수 일다거나 그들의 관계가 로멘스로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없으나 영화에선 둘 간의 로맨스적인 관계가 보인다. 그리고 펄롱의 어머니는 원인불명으로 쓰러져 이른 나이에 펄롱을 남기고 죽는다. 닉은 그 이후 펄렁 에게는 친절함과 다정함을 잃지 않고 늘 그를 응원해 주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유럽의 여느 마을 처럼 아일랜드 작은 소도시는 가톨릭 수녀원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들에게 정신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을 제공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많은 이권사업에 개입한다. 수녀원의 관할을 떠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그들은 성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끼는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수녀원의 심기를 거슬리는 것이 왜 위험한지를 서로가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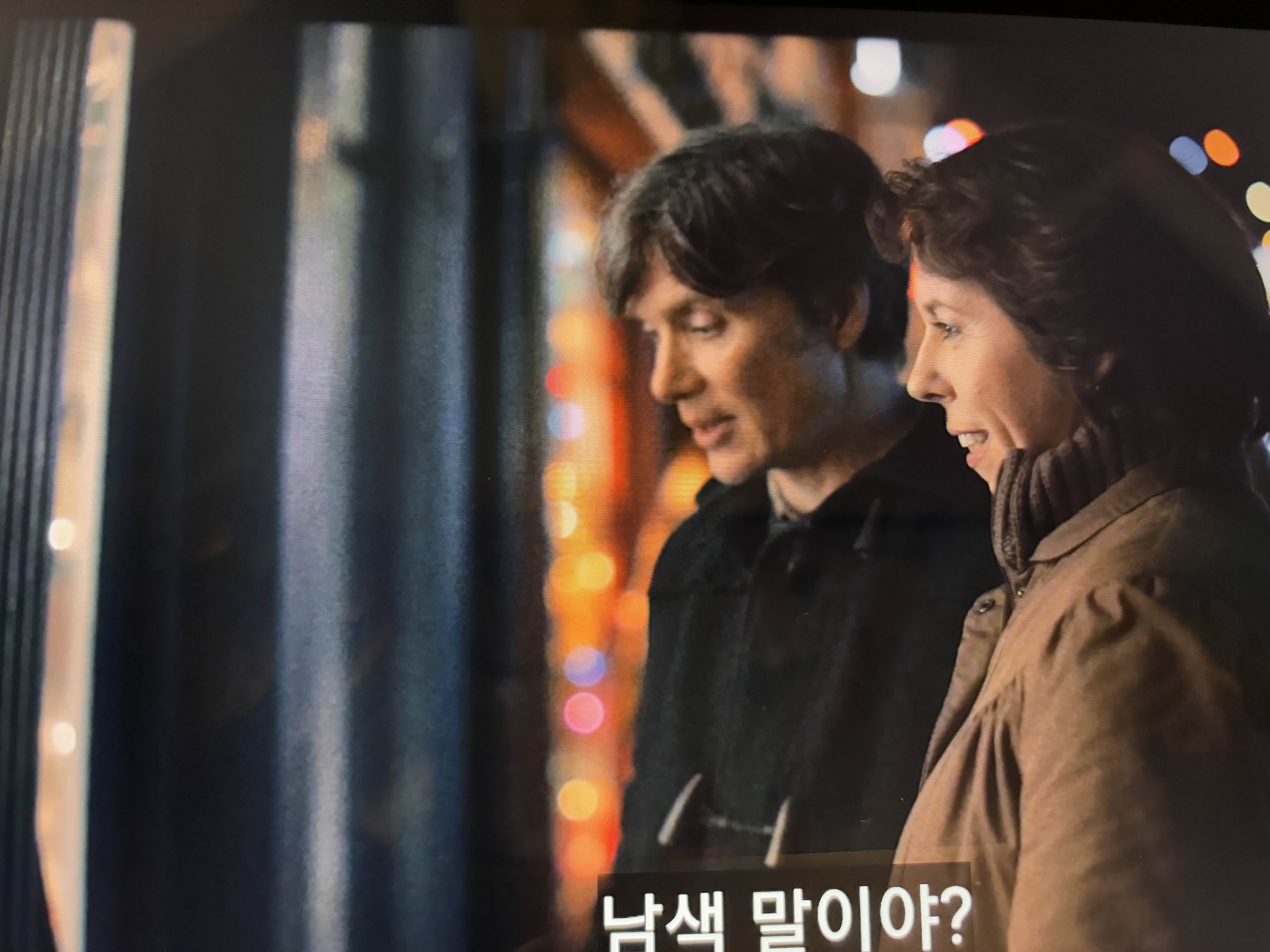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때 그들의 전통상 서로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받는다. 펄롱의 아내는 골목 신발가게에 전시되어있는 에나멜 신발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어 한다. 펄롱은 어렸을 적에 읽었던 찰스디킨슨의 책을 원한다. 과연 그는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가 늘 그렇듯이 어느 한 지점은 절대 이해하거나 공유할 수 없는 곳이 있다. 그래서 외로운 것 아닐까. 그리고 펄롱의 아내는 남편이 가난하고 가엾은 이들에 대한 연민과 작은 기여를 못마땅해한다. 윌슨처럼 걱정하며 살지 않아도 되고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부리며 사는 부호와 같은 여유 있는 처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남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냐고 펄롱에게 말한다. 펄롱은 이해받지 못한다.

사라. 우연히도 펄롱의 어머니와 같은 이름의 소녀. 그녀는 막달라 세탁소 (수녀원 운영)에서 아이를 임신한채 수용생활을 한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이 엄마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입양을 당하거나 피폐해진 강제노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반인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도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고 심지어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창고에 임신한 채로 갇히게 된다. 펄롱은 크리스마스 주간에 수녀원에 배달된 석탄 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그녀를 만나게 되고 그녀를 절대 잊지 못한다.

수녀원장은 펄롱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악한 일들을 눈치채게 된 것을 알게 되고 그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다. 그리고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펄롱의 딸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관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수녀원이 마을 공동체에 전권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한 가지 작은 선의의 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도 단순하지도 않은 복잡한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치러야 하는 결코 작지 않은 큰 일이다. 그래서 주인공은 갈등하는 것이다. 이 갈등에서 그를 주저앉게 하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만은 아니다.

펄롱은 그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동네 당골펍에 자주 들린다. 물론 술값은 그가 낸다. 그곳에서 펍의 주인 아주머니가 이미 펄롱과 수녀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대충 무엇인지 소문을 들어 알게 되었는지 그에게 충고한다. "펄롱 당신이 지금껏 성실히 일궈온 삶의 성과들을 잃을 수도 있으니 수녀원과는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 서로서로 좋지 않겠냐고. "
우리의 삶이 그렇다. 불의에 맞서는 일이 어려운 것이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아닐까.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안에 혹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다.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 그리고 그 누구보다 당신을 염려한다고 말하며 온다.

크리스마스이브. 펄롱은 그 소녀에게 드디어 간다. 아내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 슈즈를 가지고 그리고 이발소에서 말끔하게 머리를 자르고. 차마 떨쳐버리지 못한 그녀를 향한 연민과 따뜻한 마음으로 간다. 그들의 시간이 이제 시작된다. 영화의 클라이맥스. 펄롱의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작은 선의가 한 영혼에 닿고 그녀를 고통에서 건져 올린다. 기도의 힘이 아니라 동료들과 힘을 합친 것도 아닌 오직 그의 온전한 의지와 연민과 양심이 빚어낸 육체의 힘으로 불신과 두려움으로 웅크린 그녀를 고통에서 끄집어낸다.

Climbing the street towards his own front door, whith the barefooted girl and the box of shoes, his fear more than outweighed every other feeling but in his foolish heart, he not only hoped but legitimately believed that they would manage.
그렇다. 폴롱은 그 모든 감정들을 뒤로 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맨발인 소녀와 아내에게 줄 구두선물상자를 갖고 큰 산을 넘고 긴 강을 건너오듯이 가파른 계단을 오르듯 그녀를 업어서 집으로 데려온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가면 집이야.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이 어디 있을까. 그는 자신의 선의를 믿었다. " 굳건하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굳건하게 서 있겠는가"

불 켜진 따뜻한 집으로 그들은 돌아온다. 맨발의 그녀를 업어서 자신의 외투를 입혀 돌아오고 만다. 그의 오랜 갈등은 결국 선하고 따뜻한 마음에 그 자리를 양보한다. 그에게 대단히 특별한 일이 아닌 듯 일상처럼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검댕이 손을 묵묵히 씻는다. 집안에서는 그의 귀환과 상관없이 아이들과 아내의 저녁은 분주하고 시끌벅쩍하다.

그녀는 그의 바람처럼 그의 가족들 속으로 탈없이 들어갈 수 있을까. 마치 펄롱과 그의 엄마가 윌슨부인의 선의로 농장 가족의 일원이 되었듯이. 삐끗거리고, 서로 오해하고 때론 적대하며 밀어내기도 하고, 상처받고, 어쩜 다시 거리로 수녀원으로 내몰릴지도 모른다. 위태로운 그들의 동거에 마음을 다하여 응원하고 싶다. 그리고 잔잔하게 차오르는 울음을 함께 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