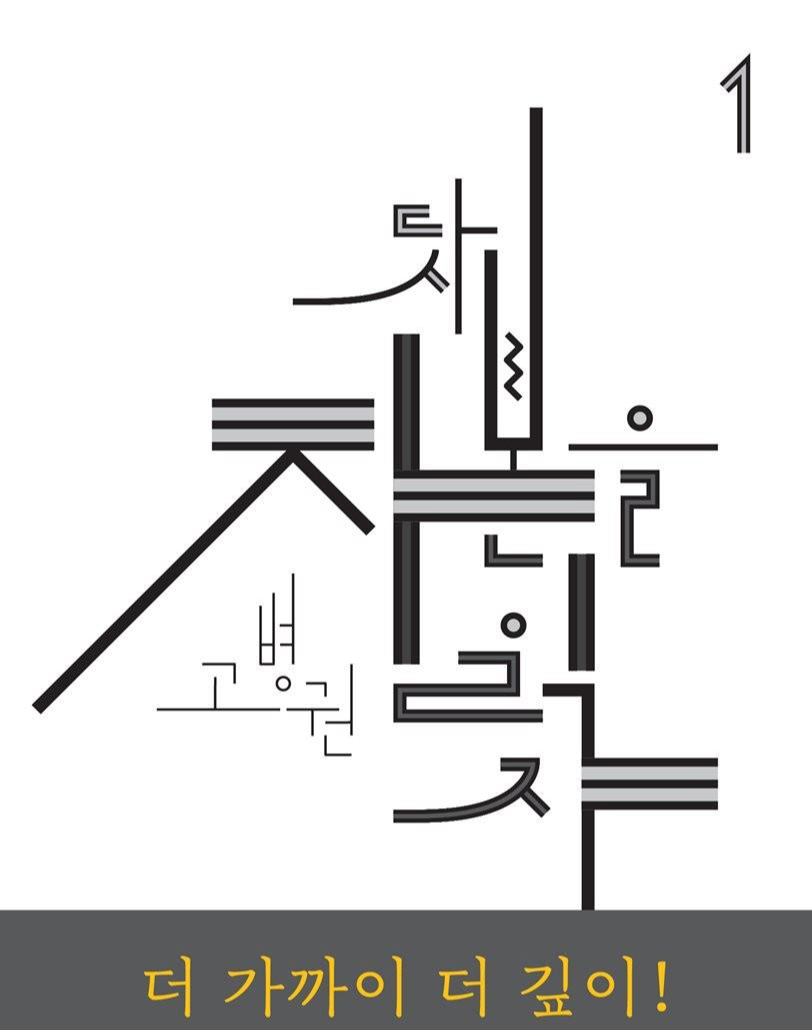
마르크스의 ‘감성적인 눈’을 발견한 철학자 고병권
『자본』을 읽는다는 건 마르크스의 ‘슬픈 눈빛’을 체험하는 일
『다시 자본을 읽자』의 저자 고병권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넘어서려 했던 사상가이기 이전에 우리 시대를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준 사람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역사학자 홉스봄 역시 마르크스의 『자본』이 나오면서 우리 시대를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시 자본을 읽자』의 저자 고병권에게 마르크스의 『자본』이 흥미로웠던 것은 이런 개념적 사항보다는 문제를 바라보는 ‘마르크스의 눈’ 때문이었다.
철학자 고병권이 마르크스와 『자본』에 감탄한 지점이 바로 여기다. ‘등가교환’이라고 하면 보통은 천 원 내고 천 원짜리 물건을 받은 것이니 ‘쿨’하게 헤어지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가교환의 한 주체는 새로운 사업 전망에 불타는 눈빛으로 어깨 으쓱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다른 한 주체는 마치 줄 것 다 주고 가죽이 되려 무두질을 기다리는 소처럼 쭈뼛쭈뼛 따라간다는 것을 마르크스의 ‘눈’이 발견해주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는 겉만 본 것을, 마르크스는 그 심층을 들여다보고, 또 다른 렌즈로 비춰보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상품을 교환하는 그 한 장면에서 어떻게 자본주의 본질을 잡아낼 수 있었을까? 물건 하나 달랑 교환하는 그 한 장면만 포착해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그 바닥 아래까지 그려내는 솜씨에 저자 고병권은 탄복한다. 저자가 보기에 그것은 마치 고고학자가 땅을 파다가 파편을 하나 발견한 뒤 그 파편에 그려진 두 사람의 동작만 보고 그들이 살았던 사회를 그려낸 것만 같다.
무엇보다 저자는 마르크스의 『자본』이 분명한 독자를 겨냥하는 다소 ‘이상한’ 책이고 더욱이 그 독자가 바로 노동자라는 데 놀란다. 그리고 저자 고병권이 보기에 마르크스는 이 책을 읽을 노동자들을 ‘계몽’하려고 쓴 책이 아니다. 그보다는 노동자들을 ‘고려’하고 ‘배려’하며, 심지어 ‘편들어주기’ 위해 쓴 책이다
다시 이 나이에, 원하는 모든 정보가 내 손아귀에 들어있는 최첨단 정보화 시대인 21세기에 어두운 골방에서 19세기 초기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영국의 가난하고 삐쩍 마른 몸이 자신의 전부이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노동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갖지 못한 무산자 프롤레타리아를 위해 날을 새며 써 내려간 마르크스의 "자본"을 다시 읽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뿔뿔이 단자화 되어 있는 휘한한 세상에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자신의 정치사회적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봉쇄당한 듯한 느낌을 늘 받았다. 적어도 아무리 세상이 문명화되었다 하더라고 세상 돌아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좀 더 알아보고 나의 사회존재적인 위치를 바로 알고 최소한 거대한 물결에 의미 없이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한 작은 노력의 시작이 이 책을 독서클럽에서 선택해서 읽기 시작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책은 고병권 선생님의 깊고 따뜻한 시선과 탁월한 해석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거대한 뿌리를 흔들기 위한 그의 깊이 있는 사색의 힘이 아직은 공부가 부족해 헤매는 나를 잘 이끌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재미있는 그의 사변적인 이야기들의 구성들이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차분히 그리고 천천히 읽어서 전권을 다 읽고 나서 내가 혹은 우리가 모두 한 인치씩 인식의 키가 커져서 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오늘은 자본 3,4권을 읽고 난 후 독서모임을 갖는 날이다.
'책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0) | 2022.06.25 |
|---|---|
|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디디의 우산 (0) | 2022.05.21 |
| 걷는 독서 (0) | 2022.04.16 |
| 보건교사 안은영...친절함이 결국 이긴다 (0) | 2022.04.09 |
| 시선으로부터 (0) | 2022.03.31 |
